728x90
300x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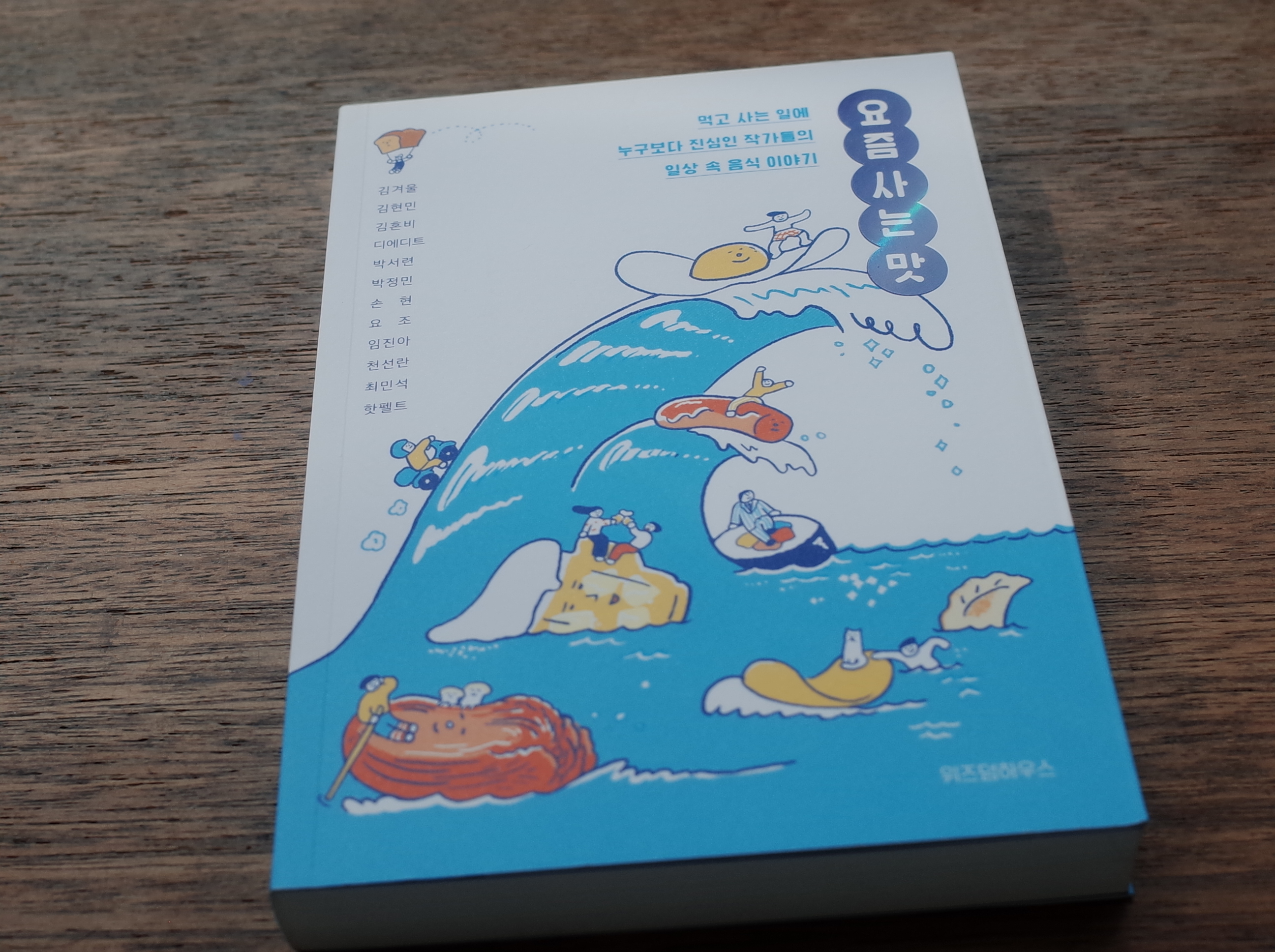
일식 돈가스와 경양식 돈가스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지? 나로 하여금 돈가스에 대한 글을 쓰게 만든 장본인에게 이 질문을 던지자 상대방은 “일식 돈가스는 두툼하고 경양식 돈가스는 얄팍하다”라고 답해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여러 차이 중 아주 사소한 한 가지에 불과하며, 고기 두께 같은 것은 요리하는 사람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하단 말인가? 일식 돈가스와 경양식 돈가스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름 아닌 소스의 양에 있다. 고기의 두께 또한 소스로 충분히 적실 수 있는가 또는 소스를 찍었음에도 식감이 보존되는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이쯤에서 일식 돈가스와 경양식 돈가스 플레이팅이 어떻게 다른지가 눈에 전해 지셨겠지요? 일식 돈가스는 고양이 앞발 모은 크기 만한 종지에 소스를 담아주고 경양식 돈가스는 고기 위에 소스를 듬뿍 부어 내주지 않습니까.
예전에 방송인 황광희 씨와 박준우 셰프가 돈가스 소스를 부먹 할 것인가 찍먹 할 것인가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실상 그건 돈가스를 일식으로 취급할 것인가 경양식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싸움이었던 셈이다. 박준우 셰프가 “돈가스는 원래 이렇게 소스에 적셔 먹는 것이다(경양식)”라는 소신을 밝히 자 항광희씨가 “그럼 왜 튀겼어요!(일식)”하고 핀잔을 주어 논쟁에서 승리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양식 돈가스 파로서 뒤늦게나마 한마디 보태자면, 튀기면 고소해지니까 튀겼겠지요. 단순히 구운 고기에 돈가스 소스를 붓는다면 그 맛이 나겠습니까? 소스에 폭삭 젖은 돈가스는 아무래도 바삭바삭한 식감이 덜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튀김옷을 입힌 정성이 어디 도망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애인은 내가 ‘일식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돈가스가 주인공인 칼럼을 써 주기를 바랐지만, 내게도 소신은 있는지라 돈가스는 수용하되 제목을 ‘경양식의 흐름’이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 내친김에 소신 발언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는 경양식이 양식이 아니라 한식의 하위 카테고리라 생각합니다. 편의상 중식으로 분류되는 자장면이 사실은 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요리인 것과 같은 이치, 소스에 푹 적신 돈가스는 돈카츠가 아니고 포크커틀릿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돈가스도 우리 민족이었어!”
- 경양식의 흐름, 소설가 박서련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싶다. 비싼 돈 주고 들어온 전셋집에서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최선을 다해 안 나가고 싶다. 앞으로 펼쳐질 이 집의 역사에서 '최장 시간 칩거 세대주 기록만큼은 뺏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의 있게, 온 힘을 다해서 안 나가고 싶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치고 집에는 라면 냄비 하나가 없다. 불멍 때리기가 유행이라기에 나도 한 번 때려볼까 하고 켰다가 가스 냄새에 멍해져서 이내 꺼버린 가스레인지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다. 냄비 없는 집에 사는 30대 노총각의 끼니는 보통 배달 음식으로 채워진다. 어엿한 식당에서 조리되어 나오는 음식은 대부분 만족스럽다.
물론 가끔 엄마 밥이 그리울 때도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배달 음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음식을 주문하고 주린 배를 최대한 움켜줘다가 초인종이 올리면 마치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식으로, “엄마, 나 밥 줘” 한다. 그러고는 “나와서 밥 먹어!”라며 엄마의 성대모사를 하고 집 앞에 놓인 음식을 집어 든다. 어느새 상에는 먹음직스러운 황금 올리브 치킨이 올라와 있다. 마치 엄마가 해준 것 같은 황금 올리브 치킨을 먹는 느낌이다. 심지어 엄마가 해준 황금 올리브 치킨보다 엄마가 해준 것 같은 황금 올리브 치킨이 훨씬 더 맛있다. 사람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 집밥, 배우 박정민

당시 도시 생활에 지쳐 '무엇이 좋은 삶인가'를 고민하던 내게 이날 식사는 큰 화두를 던졌다. 이미 자기만의 답안지를 과감히 실천해 살고 있는 이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형과 나는 그날 저녁 내내 ‘삶의 다른 길’을 정말로 갈 수 있느냐는 화두로 제법 팽팽 하게 논쟁하기도 했다. “정말로 연소득이 500만원만 되어도 지리산 산골 마을에서 살 수 있겠어? 만약 예기치 못하게 누군가 큰 병에 걸리거나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나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형의 논리를 당해낼 순 없었다.
우리가 떠나는 날 아침, 주인장은 속 시끄러운 둘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직접 구운 쿠키를 커피와 함께 주셨다. 설탕과 버터를 보통 레시피의 절반만 넣어 구운 쿠키라고 덧붙였다. 그리 달지 않고 적당히 고소한 쿠키, 향긋한 풍미의 커피를 먹으며 법정스님의 법문집 일기일회 속 한 구절이 떠올랐다.
(생략) 선방에서 정진을 하든, 절의 후원에서 일을 거들든,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든, 달리는 차 안이나 지하철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홀로 우뚝 자신의 존재 속에 앉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_법정스님, 일기일회
(생략) 주인장이 직접 구워주던 쿠키가 영화 〈매트릭스〉의 오라클이 네오에게 건네던 그 쿠키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그럼 연잎밥은 진짜 현실을 각성하게끔 하는 빨간약일까? 한 번은 연잎밥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주인장이 웃으며 답했다. “호호, 그건 기성품이에요. 인터넷에서 다 팔아요.” 그래, 연잎밥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 그걸 대하는 내 마음이 중요하지.
- 지리산 오라클의 연잎밥과 쿠키, 토스 콘텐츠 매니저 손현
728x90
728x90
'다 커버린 원숭이가 부르는 노래 > 포스트잇' 카테고리의 다른 글
| Gentle Mind, Yuhki Kuramoto (3) | 2024.06.13 |
|---|---|
| 파스타 마스터 클래스, 백지혜 (0) | 2024.06.08 |
| 정욕, 아사이 료 (0) | 2024.06.06 |
| 바람이 불어, 윤동주 (0) | 2024.05.26 |
| 역사의 쓸모, 최태성 (0) | 2024.05.14 |



